[학술 생태계의 안타까운 현실]
약탈적 학술지의 위험성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꿈꿀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논문을 집필하고 게재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며 학술 생태계를 어지럽게 한다.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그중 한 예다.
약탈적 학술지는 어린 고등학생부터 고위 공직자, 심지어 학계까지 이미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다. 2019년에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동호가 부실 학회에 참석한 일이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가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약탈적 학술지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보도된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5년간 연구재단의 R&D 지원을 받은 SCI급 논문에서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연구를 제외한 12만 6505편 중 무려 2만 103편으로 15.9%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광복 이사장은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연구성과 공유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내 학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교의 연구자들 또한 약탈적 학술지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예방책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오픈액세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부실 의심 학술지에 70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부실 의심 학술지에 각각 903편과 717편의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문의 보고라고 일컫는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이기에 본교 역시 연구 행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약탈적 학술지·학회가 신인 연구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원생이나 연구 논문 투고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더 위험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해 알아보고 본교 연구자들이 해당 학술지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며, 예방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약탈적 학술지란
약탈적 학술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미국 콜로라도대학의 도서관학자인 제프리 빌(Jeffrey Beall)의 공론화 덕분이었다. 그가 최소한의 내부 검증 과정이나 동료 심사 없이 논문의 게재를 보장하는 일부 출판사와 저널들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용어가 개념화됐다. KISTI가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이하 SAFE)의 정의에 따르면, 약탈적 학술지는 오픈액세스 모델(Open Access Model)이 독자가 아닌 저자에게 출판료를 받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이에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돈을 지불하면 논문을 무조건 게재해주고,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그 과정을 간소화해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의미한다. 연구 내용의 질과 상관없이 오직 ‘돈’ 하나로 연구 부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약탈적 학술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이를 악용하기도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가 연구자들을 유혹하는 상황도 있다. 실제로 SAFE에 게시된 부실 학술행사 누리집에 접속한 결과, 대부분의 학술행사가 신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능을 가진 ‘젊은’ 연구원 혹은 ‘대학원생’에게 권위 있는 상을 수여하고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해당 학술지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2019)을 살펴보면 약탈적 학술지와 일반 학술지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약탈적 학술지는 동료심사가 부실하며 원고에 대한 수정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학술지는 동료심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는 저자에게 출판비용이나 게재료를 받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화돼 있다. 따라서 게재를 보장하거나 짧은 기간 내 심사를 선전한다면 이를 의심해 봐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격적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일반학술지의 누리집에 비해 색감이 화려하며 배너를 클릭했을 때, 광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 높은 영향력 지수를 강조한다. 심지어는 일반 학회지의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을 누리집에 게재해 학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투고 전에 저널의 이름과 영향력 지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ISSN도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운영진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메일 주소만 나와있다거나 실제로 없는 주소를 게재하는 등 학술지의 연락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일반학술지와 달리 출판증서를 수여하거나 논문심사료와 게재료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는 등의 특징도 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알고 논문을 투고하기 전 자신이 게재할 곳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본다면, 약탈적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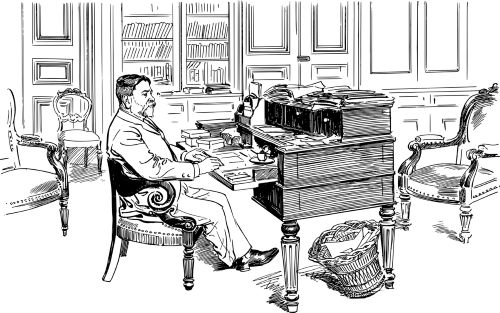
정직한 연구자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먼저, 국가는 부실학회 참가 혹은 부실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연구비를 받으며 부실학회에 참가하거나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사업비 지출은 환수 된다. 또한, SAFE를 통해 부실 학술지와 학회들을 공개하며 연구자들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이끌리지 않도록 돕고 있다. SAFE 누리집의 부실 학술행사 검색창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의심 가는 학술행사를 구별할 수 있다. 단순 검색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SAFE에 요청해 의심 학술행사 및 학술지 검토 또한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지난달 6일 열린 ‘오픈액세스와 부실학술지’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부적절 행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본교는 연구윤리 재확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본교 윤리센터는 윤리교육 영상을 게시해 학생들이 연구윤리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영상은 연구윤리를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 등 양질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 본교 소속 연구자의 연구활동 관련 부정행위 예방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윤리부정 신고를 관리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혹은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다양한 연구 윤리 교육을 수강하는 것 외에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행사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SAFE에 신고하거나 공유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학술지를 SAFE에 검색하거나, ‘Beall’s list’ 누리집을 참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은 약탈적 학술지 용어를 처음 공론화시킨 제프리 빌이 작성한 부실 학술지 리스트를 보유 중이다. 약탈적 학술지에 참가한 이들은 금전적·시간적 상황을 이유로, 혹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며 명백히 학술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정 행위임을 밝히고 싶다.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속한 학술계라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부정 행위를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자신과 동료들의 연구를 보호해야 한다. 본교를 비롯한 모든 연구자들이 당장의 학위 취득에 급급하기보다는 학술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이바지하며 자신의 실적까지 챙길 수 있길 바란다.
김주은 편집위원 | wdhappy12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