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길
‘학제간연구’, 아직은 먼 이야기
하루는 영국의 통계학자 율(G. U. Yule)이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의 유전학 교수 퍼넷(R. C. Punnett)에게 단지증(短指症)과 관련하여 문의를 했다. ‘단지증유발인자가 우성형질이라면, 결국 미래의 모든 사람은 단지증 환자가 되는 것인가.’ 퍼넷은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친구인 하디(G. H. Hardy)와 저녁식사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학자였던 하디는 그 자리에서 곱셈공식 (p+q)2=p2+2pq+q2을 사용해 간단하게 그것을 증명했다. 집단유전학의 중요한 기본이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Hardy-Weinberg principle)’은 이렇게 탄생했다.

최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학제간연구’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둘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목들이 동원된 연구를 말한다. 모든 연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처럼 어떤 학문분야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 이른바 난제(難堤)를 다른 분야에서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학제간연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교 대학원의 ‘학제간연구’는 현재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일단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조적 측면은 ‘학교에서는 무엇이 진행되는가’의 문제이며 두 번째 구성원 측면은 ‘실질적으로 학제간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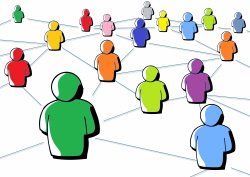
‘학제간연구’의 현주소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2005년 문화연구학 과정이 대학원에 신설된 이후 본교도 ‘학제간연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2008년에는 학제간 교육 강화를 모토로 하여 학부에 ‘융합·연계 전공’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본다면야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 과정’으로 분류되는 전공의 개수가 15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살펴보자면, 2010년 통합된 ‘아동청소년학과’의 경우는 본교의 기업논리에 따른 구조조정 결과 탄생한 것이다. 2015년 신설된 ‘융합보안학과’는 명칭에서부터 ‘융합’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해 신설된 ‘제약산업학과’도 일단 명칭에서 결합의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 그중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의 ‘창업학과’ 박사과정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는, 이중 상당수가 2015년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은 교육부가 당시에 마련했던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이른바 ‘PRIME 사업’으로 인해 여러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을 통해 이공계 정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시기다. 당시 PRIME 사업이 최우수 선정 대학에게 ‘3년간 300억 원 지원’, 상위 8개 대학에게도 ‘150억 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교는 PRIME 사업에 탈락했지만, 어쨌든 PRIME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학과 간 협동과정’들이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학원(302관) 지하에는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이 운영하는 ‘학제간연구실’이 있다. ‘학제간연구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원총 산하에는 ‘학술단체위원회(이하 학단위)’가 있다. 학단위에서는 일정기준이상의 연구 집단(학과 또는 세미나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연구회별로 2석씩 연구공간을 배정하는데, 그 연구공간이 바로 ‘학제간연구실’이다. 공민표 원총회장은 “학단위는 매학기별로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 연합학술제를 개최하고, 학술지 《중앙아람》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학제간연구실’에는 ‘학제간연구’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기원 원우(심리학과)는 “학제간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서로 각자 전공에 바빠서 대화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신 원우는 5학제간연구실에서 임상심리전공, 교육학 상담전공 원우들과 함께 연구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원우 역시 “학제간연구실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별다른 교류가 없다”며, “방학기간 제출하는 결과물도 개별적으로 제출하므로 다른 학제의 도움이 주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 회장 역시 “‘학제간연구’라는 명칭은, 당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상 애초에 ‘학제간연구’가 목적은 아니었던 셈이다.

접합에서 융합으로
‘학제간연구’가 이뤄지는 과정을 집약하는 개념이 있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 O. Wilson)이 제안한 ‘통섭’이 그것으로, 지식의 통합 또는 학문 사이의 융합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통합이라고 해서 다수 분야를 한데 모으는 ‘물리적 접합’을 통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물리학자, 사회학자, 생물학자, 철학자가 모여 각각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학제간연구’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통섭을 어디까지나 ‘화학적 융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학으로 사회학하기’ ‘생물학으로 철학하기’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돼,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교의 ‘학제간연구’는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 본부의 행보를 미뤄본다면 그간 신설된 각종 연계 및 융합과정은 본부의 이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리적 접합’에 그쳤다. 물론 접합이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 화학적 융합을 위해서는 일단 접합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를 전해준 ‘학제간연구실’의 신 원우 역시 “어쨌든 다른 전공자를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가며 보고 듣는 것이 전혀 의미 없다고는 생각치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교의 ‘학제간연구’가 구색 맞추기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코 지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희수 대학원장(교육학과)은 취임 후 인터뷰에서 본교가 ‘연구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연구능력 강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앞으로 ‘학제간연구’가 얼마나 제대로 안착되는가의 문제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본교에서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나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같은 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조현준 편집위원|dision99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