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미 / 사회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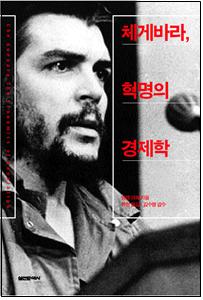
2012년 1월, 다보스 포럼의 의제는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을 구성하기’였다. 20세기식 자본주의가 에포크를 맞이하던 시기에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그 미국식 자본주의의 황혼에 서서 지배 엘리트 그룹이 먼저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보스 포럼은 이 의제를 내건 이유를 전세계적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금 우리가 진정 전환기의 정세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새로운 모델인가?
다보스 포럼은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를 ‘도덕성의 실패’로 꼽았다. 자본주의란 본래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으로 은유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탄의 맷돌’이 아니었던가. 지배 엘리트의 축에서 먼저 도덕성의 실패를 성토하고 있는 아이러니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 그들이 우려하는 도덕성이 기업가 혹은 부르주아지의 건전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국면한 99%의 노동하는 인간들을 위한 도덕성이다.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근원적인 범주를 꼽자면 그것은 노동, 생명,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인간을 구획하거나 분할하여 설명하는 것이기보다, 그 자체로 인간의 본연이다. 특히 인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느 역사에서나 노동하는 주체였고, 노동으로써 세계를 구성하는 객체였으며, 노동으로써 세계의 실체가 돼왔다.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어느 부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 99% 노동자에 대한 도덕성의 상실은 인간에 대한 상실이며, 자본은 이제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자유라는 이념의 극적인 환상에 막연히 의존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사탄의 맷돌이 스스로 건전한 기업가 혹은 부르주아지라는 수행적 윤리가 아닌 진정한 도덕성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체 게바라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다름 아닌 혁명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당면한 과제들과 씨름하는 장관이자 경제 관리자로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가 정통 사회주의와 다른 ‘이단적인’ 조치들을 취했음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쿠바가 미국과 자본주의 국제관계에 대항하는 ‘이중 자립’의 난제에 처해 있었음을 설명한다. 저발전국가들의 단일작물경제 시스템이나 남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횡포는 장기지속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산물이었음을 모두 주지하는 바, 쿠바 혁명의 공고화가 한 국가 내부의 문제일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1960년대의 정세에서 실험됐던 체 게바라의 혁명의 경제학이나 이단적 사회주의 모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역사의 지속 내부에서 마주하는 정세가 긴장을 드러낼 때, 가장 이상화된 영웅의 과업이 하나의 사실로서 ‘혁명의 경제학’으로 던져지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모델은 사회의 현실을 제약함으로써 가능해지겠지만, 그 가능성으로 사회를 온전히 구획하거나 인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넘어설 수는 없다. 노동의 문제 역시 그러할 것인데, 노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때때로 문제해결에 대한 종속성을 만들고 연대성의 폭을 좁히게 되지는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저 사탄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유의 아이러니를 온전히 해결치도 못했는데 말이다.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자유의 극적 환상을 깰 수 있는 생명으로서의 노동, 인간의 문제로서의 노동을 무엇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기업가의 자유는 누구의 환상으로부터 유래했는가? 사회에 대한 특정한 모델로 그 환상에 대항할 수 있는가?
체 게바라의 패셔너블함이 소위 ‘쿨’함의 정서로 팔려나가는 것이야말로 애석하겠으나, 1960년대 체 게바라의 ‘혁명의 경제학’을 사실이 아닌 희망으로 읽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애석한 일일 것이다.
황인찬 기자
mirion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