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미 / 사회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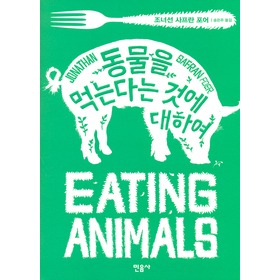
육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논의되는 문제들이 있다. 공장식 축산과 도축, 농장 경영과 식량의 경제학에 따른 거대한 이야기와 그에 덧붙여 그 식자재들로부터 오는 질병, 항생제에 대한 내성, 잠재적 유행병 등이 그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합리주의자들이라면 단지 그 강력하고 모골이 송연한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곧 알아차릴 것이다. 동물들의 삶과 죽음의 비참함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우리가 먹는 동물의 99% 이상이 공장식 축산에서 나온다는 사실, 적어도 그 강력한 사실만 인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어의 책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인간은 동물을 지금과 같이 싼 값에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해놓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그 합리적 시스템의 빈틈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저자의 공격은 꽤나 통쾌한 비수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포어가 간과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동물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인간은 동물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단지 그것들을 은유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권위만을 지녔다. 여기에 더 큰 문제들이 기인한다. 저자가 말하는 종간장벽처럼 우리는 지구 육지의 3분의 1에 가까운 면적에 먹기 위한 가축을 기르면서,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멍청한 코알라는 보호하고 개를 먹는 것은 혐오한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망에 포섭되느냐에 따라 동물종의 운명이 달라져왔다. 물고기의 멍해 보이는 눈이 품은 심연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고, 인간과 비슷한 지능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지능이 대체 뭐라고) 인간은 물고기를 먹기에 더 편한 존재로 대해온 것이다. 더 넓혀보자면 이러한 종간장벽으로 유태인은 한때 학살된 것이고, 죽은 자의 소생을 위해 여자들이 죽은 이의 살을 먹고 그가 그녀의 자식으로 잉태되기를 기원하는 어느 식인종 부족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떠한 종을 마구 먹어도 좋다는 암묵적 동의를 만들어내는 종간장벽은 사실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가 배태하는 윤리란 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동물인가, 아닌가?
어떤 종의 동물을 식자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란 없어 보인다. 이런 마당에 그것들을 어떻게 키우고 죽여서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권한은 더욱 없어 보이고, 단지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생을 인간의 세계에서 등급을 나누어 은유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은유의 권력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매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공장식 축산과 동물 학살을 행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를 윤리적으로 타락시킨다. 포어가 지적하는 공장식 축산(어업을 포함)과 우리의 식문화는 우리가 이미 그 타락의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단지 고기가 되기 위해 태어나 죽어가는 동물들의 고통을 놀랄 만큼 쉽게 잊겠지만, 그의 글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를 응시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젊은 여자는 햇살이 많은 초록빛 언덕으로 돼지와 함께 놀며 뛰어올라가 돼지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조용하고 빠르게 칼로 목을 베어 돼지를 죽인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지만 병으로 죽음을 앞둔 남자 또한 그의 청으로 언덕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인다. 영화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감독 스벤 타딕켄, 2006)의 이야기다. 돼지를 식자재가 아닌 친구로 여겼던 농장주인 여자가 택하는 죽음의 방식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됐다. 생명의 근간이나 철학적 범주를 충분히 논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것이 은유되는 방식만이라도 어렵게 여겨야 한다.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기에도 적합한 방식이라면 그것으로 돼지를 죽여도 좋다. 채식을 선언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 윤리적 고기를 공급하라.
황인찬 기자
mirion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