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 본교 국어국문학과 교수ㆍ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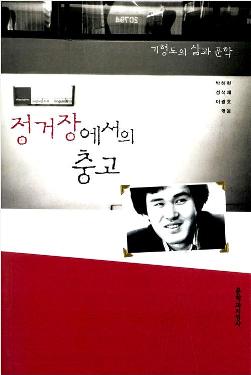
<정거장에서의 충고-기형도의 삶과 문학>
박해현ㆍ성석제ㆍ이광호 엮음 (문학과지성사, 2009)
폐허를 건너는 시의식의 아름다움
느닷없이 닥친 죽음이 그의 삶과 시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든 시인이 있다. 어느덧 사후 20주기를 맞은 기형도 시인은 내 청춘의 먼지 쌓인 골방에 오래 머물렀던 시인이기도 하다. 대학 3학년 때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유고 시집을 통해 기형도라는 낯선 시인을 처음 알았다. 이름도 기이했던 그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으므로, 그 만남은 한층 더 강렬했던 것 같다. 20대의 마지막을 1980년대의 마지막 해에 닫아버린 시인. 20대와 80년대에 동시에 종언을 고한 그의 죽음은 종로거리의 심야 삼류극장에서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통속성을 동반한 채 풍문으로 오래 떠돌았다. 그 때문인지 그의 시는 늘 수상한 죽음의 기운을 거느리고 있어야 했다. 아마 여기엔 요절한 시인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시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명명했던 평론가 김현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그 역시, 지금 여기에 없는 존재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기형도의 시는 80년대를 닫으며 90년대를 열었고, 이후 영원한 청춘의 이름을 획득한다. 방황하고 고뇌하는 청춘이 있고 고통 속에서 빛나는 청춘이 있는 한, 그의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청춘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읽힐 것이다.
기형도의 시를 기억하는 일은 자기고백을 동반한다. 기형도의 시에 대해 말을 꺼낼 때마다 처음 기형도 시를 읽었던 그 순간이 내게도 화인처럼 떠오른다. 저마다 기형도에 관해서 그런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먼지의 방’에서 그를 아껴 읽던 기억이나 그의 거대해져 버린 그림자에 치여 시를 앓아야 했던 기억 말이다. 기형도 사후 20주기를 맞이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한 <정거장에서의 충고>는 기형도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일 수 있는지를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 <정거장에서의 충고>는 첫 시집을 준비하면서 기형도가 시집의 제목으로 삼으려 했던 문구라고 한다. 아마도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첫 시집이 출간되었다면 기형도 시집에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분위기는 이렇듯 지배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첫 시집을 유고시집으로 출간하는 시인에게 어울리는 시집 제목으로 고른 것이 ‘입 속의 검은 잎’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바뀐 기형도의 첫 시집은 죽음의 냄새를 한층 더 진하게 피워 올린다. 그러고 보면 기형도의 20주기를 기념하는 책 제목을 <정거장에서의 충고>로 삼은 것은 꽤 탁월한 선택이었다.
마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마침표
<정거장에서의 충고>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기형도에 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2부에는 직간접적으로 기형도와 만났던 이들이 기형도에 대해 기억하는 산문을 실었으며, 3부에는 기형도에 관한 대표적인 비평들을 실었다. 이 중 제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1부이다. ‘포스트-기형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심보선, 김행숙, 하재연, 김경주 시인과 조강석 평론가가 90년대 이후 세대이자 2000년대에 주로 활동한 젊은 시인들에게 기형도의 시가 지니는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의 시적 출발의 자리에 기형도라는 기억이 저마다 웅크리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로부터 이미 신화가 된 기형도라는 상징이 이들 세대에게 끼친 영향의 흔적을 읽어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좀더 흥미로운 것은 기형도가 분할하며 잇는 저 예민한 경계에서 이 젊은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미학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기형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러저러한 풍문들을 넘어서는 실체로서의 기형도 시가 그곳에는 있다. 그런 점에서 <정거장에서의 충고>는 기형도 신화에 대한 또 하나의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신화를 깨거나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기형도의 시를 읽고 그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는 심보선의 지적이나, 비극적이기 때문에 더욱 감상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기형도의 시에서 미학적으로 구성되면서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하재연의 지적은 되새길 만하다. 한동안 우리는 그의 비극적이면서도 수상한 죽음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기형도의 시를 온전히 시의 자리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잉의 시선을 걷어내는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의 시에 과도한 비극성을 부여하는 시선이나 그의 시를 얄팍한 감상주의로 폄하하는 시선이나 과잉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풍문이 구성한 신화에서 걸어 나와 그의 시를 다시 봐야 할 때이다.
살아 있는 청춘의 윤리
기형도의 시는, 시를 가르치고 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현장의 강의실에서 여전히 소통가능한 시다. 교과서에서 배운 시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시인이 거의 없고 시에 대해 도통 관심이라고는 없는 학생들의 입에서도 기형도라는 이름은 간간이 들먹여진다. 그의 시가 읽히는 진폭도 생각보다 넓다. 「빈집」이나 「엄마 생각」이나 「위험한 가계 1969」같은 시가 좀더 대중적으로 읽힌다면, 「질투는 나의 힘」, 「정거장에서의 충고」, 「입 속의 검은 잎」, 「안개」, 「포도밭 묘지 2」 등은 한결 예민하고 강렬하게 읽힌다. 기형도가 죽은 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도 묘하게 기형도는 말을 건넨다. 그것은 기형도 시가 지니고 있는 ‘영원한 청춘’의 상징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이미 구축된 기형도 신화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20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 그의 시가 여전히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까닭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부정하는 환멸의 시선이 그의 시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폐허로 인식하면서도 그 폐허를 견디며 건너는 청춘의 윤리를 그의 시에서 목격할 수 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