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 영어영문학과 박사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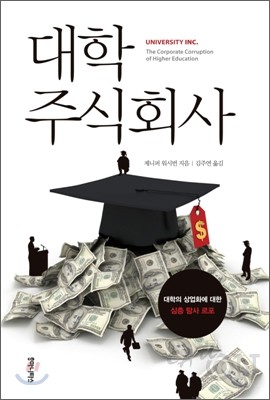
개인적인 일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필자는 출강하고 있는 모 대학 항공서비스학과 교양영어 강의 첫 시간에 생경한 경험을 했다. 강의를 시작하기 직전 수강생 한 명이 일어나 좌우 뒤쪽을 살펴본 뒤 “차렷, 인사”라는 구령을 외치자 전 수강생이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일순간 경직되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지 난감했다. 항공 승무원을 꿈꾸고 장래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필자에게는 ‘선생과 학생의 학문 공동체’라는 본연의 취지로 출발했던 ‘대학’의 위상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으로 비춰졌다. 한 주 동안 고민한 뒤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결국 이 같은 의식을 그만 둘 것을 조심스레 그리고 완곡하게 부탁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서비스 산업의 메커니즘인 고용인과 피고용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또 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날 대학의 정체성은 확실히 수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클라크 커어는 <대학의 효용>(1963)에서 당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에 직면한 대학의 난감한 상황 앞에서 ‘다원대학’(multiversity)이라는 개념을 제출했다. 교수와 학생 중심의 단원적 대학(university) 대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후에 커어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 대학이 공공의 복리 대신 민간 기업의 이익에 휘둘리는 딱한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본 뒤였다.
제니퍼 워시번은 <대학 주식회사>에서 오늘날 미국 대학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학 및 중소기업 특허절차법’, 소위 베이-돌 법을 지목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학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의 결과물로 특허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후 거액의 공적 세금이 들어간 연구가 공공 부문으로 환원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전례 없는 산학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마이클 폴라니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정보 공개”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의 소유 여부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이 같은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의 정당성이 공감될 리 만무했다. 비유하자면 폴라니의 ‘과학 공화국’은 현재 ‘과학 전제국(專制國)’으로 전락했다.
대학은 오랜 세월 동안 연구와 교육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 같은 균형은 현재 연구 쪽의 압승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방향성 또한 그리 건강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공성 대신 업적이나 특허권 위주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연구 업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체제가 필시 이 땅에 ‘카이스트 사태’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기초 학문인 인문학의 미래 또한 암담하다. 일례로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는 영문과 교수들이 근대 영시의 아버지인 제프리 초서가 공학이나 경영학 과정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썼다. 그래서일까, 취업률을 근거로 인문학과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곳’에서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 확실히, (인)문학을 사랑한다는 고백 따위는 어쩐지 쑥스러운 비밀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마저 인문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작금의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부응해야 할 인재에게 인문학의 가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대학이 대학(大學)이 되는 건 어찌 된 일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