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호 / 문화연구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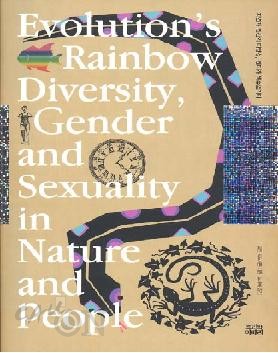
진화생물학자가 쓴 이 책은 인문학자에게도 상당히 흥미롭다. 저자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크로스 드레싱, 트랜스젠더, 동성 섹슈얼리티, 성역할 바꾸기가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방대한 자료와 사례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나 트랜스 젠더가 인간에게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오히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녀가 성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까닭은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물들의 성행위는 번식 외에도 재화의 분배, 갈등의 해소, 외부자의 융화, 공동체 형성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들은 이분화된 성 구분을 넘어선 기능들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새롭게 느껴진다. 우리는 동물계에 존재하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다. 이는 특정한 (이성애중심주의라는) 과학적, 정치적 편견들이 그런 주제에 대한 연구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하나의 사례로 1992년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미국인의 성 관련 습관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는데, 이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두 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의해 중지될 뻔 했다. 그들은 그 연구를 ‘동성애 아젠다’로 여기고 ‘그런 연구 대신 혼전 순결을 장려하는 데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나 자본의 개입이 연구의 방향성을 규정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동물 뿐 아니라, 인간의 성에 관한 편견들과도 힘겹게 대결해 나간다. 성적 차이, 즉 뇌의 구조, 호르몬 등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며 결코 그 차이들이 사회적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분석 중 흥미로운 지점은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다. 심리학자들이 ‘다양성을 병리 현상으로 여기는 의학 모형’에 따라 연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이를 병리화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그녀는 성적 다양성이 심리적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과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그것들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고, 다시 그 내부에서 수많은 개별성들로 분화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성적 차이가 야기한 적대나 배제가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MTF(Male-To-Female) 트랜스젠더이기도 한 그녀가 스스로 ‘트랜스젠더 의제’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 목록에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품위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용·교육·결혼·군복무 등의 영역에 대한 동등한 참여, 의료보험 혜택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것들은 새로운 요구라기보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제안되어온 요구들이다.
그런데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나 ‘관용’은 성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적대와 불평등, 배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봉합하고 탈정치화하는 담론이기도 하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를 묵인하고(설사 그것이 투쟁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의 시혜를 기다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 진화의 무지개가 있다. 이제 그 무지개만 보지 말고, 그 너머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