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 <아이뉴스24> 기자
20세기 문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같은 작품들은 선형적인 사건의 흐름보다는 인간 내면세계를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작가들은 겉으로 드러난 시간 순서를 무시한 자유 연상적인 글쓰기를 선보였다.
인간의 의식을 포착한 글쓰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비단 작가들뿐만이 아니었다. 하이퍼텍스트 이론가들 역시 자유 연상에 바탕을 둔 비선형적인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제너두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한 문서 우주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던 테드 넬슨은 1960년대에 ‘하이퍼텍스트’라는 신조어로 이런 상황을 묘사했다. 넬슨은 하이퍼텍스트에 대해 독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비순차적 글쓰기(non-sequential writing)’로서, 상호작용성을 구비한 컴퓨터 스크린에서 가장 잘 읽힐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서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단일한 중심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기 힘들다. 책에서 본문과 각주의 자리바꿈 현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한 예다. 본문에 부차적인 요소로 각주가 따라붙는 종이책과 달리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각주가 텍스트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각주가 일반화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독자들이 덧붙인 각주도 저자의 텍스트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조지 란도는 이런 점을 들어 하이퍼텍스트가 독자와 작가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이상적인 텍스트의 또 다른 특징을 실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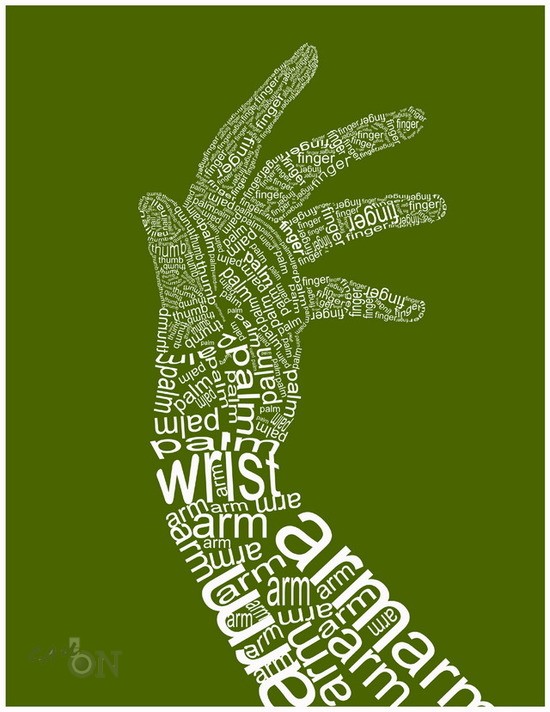
쓰기 텍스트, 독자에게 권위를 넘기다
바르트는 일찍이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로 나눴다. 읽기 텍스트는 독자가 그저 읽도록 만들어진 책을 의미하며, 쓰기 텍스트는 독자들이 직접 쓰도록 유도하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것이 읽기 텍스트라면, 무언가를 읽은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쓰기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저자와 독자 간에 엄격한 장벽이 가로 놓여 있던 시기에는 쓰기 텍스트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뭔가를 ‘쓰는 것’은 저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자와 수용자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저자의 일방적인 글쓰기보다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하이퍼텍스트는 저자의 권위 중 일부를 독자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저자와 독자 간의 평준화를 이끌어내며, 이로 인해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저자와 독자 간의 공동 작업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공간의 능동적인 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텍스트의 특정 판본을 생산할 때 필연적으로 저자와 협력 작업을 하게 된다. 어떤 문서든 하이퍼텍스트 환경에 나타나는 순간 좀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그 시스템에 있는 다른 자료와 관계를 맺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저자 역할을 하는 경지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 환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쓰기 텍스트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미디어에서 공동 작업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뉴스의 생산자와 수용자, 기자와 독자 간의 구분이 조금씩 무력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들은 아예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되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공동 저자 역할을 하면서 전문 저널리스트의 영역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란 대선이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때 블로그 및 UCC사이트를 통해 행해졌던 수많은 보도 활동들이 바로 그 예다. 이렇게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뉴스뿐 아니라 댓글이나 카페, 토론방 같은 곳의 콘텐츠까지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저널리즘에서도 쓰기 텍스트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에서의 읽기는 쓰기와 직접 연결되어 ‘쓰기로서의 읽기(reading-as-writ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블로그는 존재하는 텍스트를 취한 뒤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방식으로 의견이 덧붙여진 블로그는 트랙백을 통해 능동적 독자의 텍스트와 연결되고, 그것에 통합시킴으로써 토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현상은 바르트가 말한 쓰기 텍스트를 실제로 구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독자의 참여와 새로운 성찰의 계기
‘읽기’에서 ‘읽고 쓰기’로의 전환은 수용자의 권력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읽기만 가능한 시스템에서 독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의 읽기 순서를 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반면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쓰기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자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수용자에게 분산되면서 이른바 권력의 탈중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변화가 과연 문학 작품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쉽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볼터가 지적한 것처럼, 독자들은 ‘쓰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라’는 저자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하이퍼텍스트 소설 실험이 마이클 조이스의 <오후>를 비롯한 몇몇 작품들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이퍼텍스트로 인해 현실화된 ‘쓰기 텍스트’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은 소중하다. 이미 저널리즘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생산자들이 독점하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읽기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산 욕구를 불태우면서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 열리고 있다. 문학이라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권력을 내놓으라’는 하이퍼텍스트의 요구 자체가 저자들에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줄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