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찬 / 수유너머N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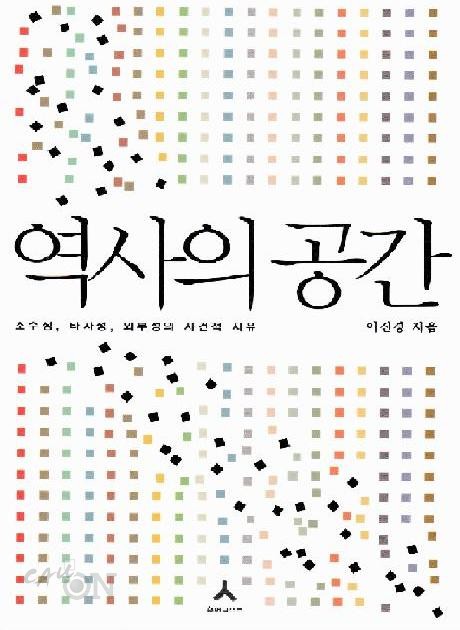
<역사의 공간>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일종의 역사평론집이다. 이진경 판 ‘거꾸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계기에 의해서 쓰인 글 모음이고, 학술논문에서 칼럼에 이르기까지 글의 성격도 아주 다양하지만, 각각의 글을 가로지르는 저자의 문제설정과 사유의 전개는 놀라운 일관성과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20여 년이 넘도록 지속된 저자 자신의 삶의 궤적의 산물이다. 저자는 삶의 잠재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자본주의와 민족 국가라는 벽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탐색이라는 일관된 화두를 가지고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역사의 공간’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이곳을 다시 사유할 자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를 포함해 책에 묶인 15편의 글들은 각각의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발표된 시간 순서가 아닌 논리적 순서와 글이 다루고 있는 시기에 따라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역사와 시간의 미시정치학’에 실린 3편의 글은 ‘역사’와 ‘진보’에 접근하는 저자의 기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적 성격의 글로, ‘소수적인 역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관통된다. 저자는 모든 사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하는 다수적(major) 역사 개념에 맞서, “상이한 종류의 역사성을 갖는 인민들이 만나고 모이고 분기하면서 변이되고 전염되는 방식으로 증식되는 양상을 표시하는 지도 그리기”로서의 새로운 역사 개념, 즉 소수적(minor) 역사 개념을 제안한다.
‘시간과 역사의 표상공간’이라는 제목의 2부에는 조선 후기 <세시기(歲時記)>와 근대 초기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대해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고고학적 분석’을 하고 있다. 저자는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근대적 시간’과 ‘근대적 영토’의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특히 서구적인 근대적 역사 ‘관념’의 수입과 그 관념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역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7, 8장이 흥미롭다. 대문자 역사(History)는 한편으로는 서구의 ‘선형적 시간’과 ‘진보’라는 관념의 수입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단군’이라는 ‘위대한 기원의 발견’과 ‘민족과 국민의 발명’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지고 구성된 관념이자 단어라는 것이다.
‘사건, 혹은 역사의 외부’라는 제목의 3부로 묶인 7편의 글들은, 다루고 있는 시기의 폭이나 글의 성격에서 가장 큰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9장 ‘식민지 인민은 말할 수 있는가?’는 일제 말기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제기한 ‘동아 신질서론’과 이에 대한 조선의 친일파 지식인들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다. 일본 지식인들의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더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그 허구성을 밝히는 저자의 아이러니 전략과, 해방 이후 친일파 지식인으로 ‘역사’에서 배제된 인물들의 담론에서 일종의 저항으로서의 ‘유머(또는 내파)의 전략’, ‘횡단의 전략’을 읽어내는 저자의 태도는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이다. 10장은 1960-70년대에 국가가 주도했던 가족계획사업이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근대적인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켜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에는 최근 저자의 일관된 이론적 관심사 중 하나인 생명정치학적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있다. 11장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의 역사’에 대해 일본 지식인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인 글이자, 현재의 한국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어지는 3편의 글에 대한 일종의 전사(前史) 또는 서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 투쟁,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촛불시위와 같은 당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3편의 글을 관류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대중의 흐름’ 또는 ‘흐름으로서의 대중’일 것이다. 그는 흐름으로서의 대중을 “일상적 지위나 소속, 신원이나 이름에서 이탈하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 정의하며,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흐름의 공간’과 함께 등장한 이 새로운 대중의 흐름에서 점점 강고해지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저항과 창조의 잠재력을 읽어낸다. 하지만 그 흐름이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그 벽의 다른 이름은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책의 에필로그 제목(‘도그빌, 이주자들을 착취하는 개 같은 나라’)과 문체가 감정적으로 가장 뜨거워진 이유일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엮는 동안 자신이 품었던 어떤 ‘몽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또 한 명의 스승이자 친구인 일본인 모리사키와 함께 ‘왜구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역사’를 꿈꾸었다고 말한다. 단순히 일본인 해적이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 오키나와인은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인들까지 포함한 말 그대로 혼성적인 집단이었고, 대부분 자신의 국가에 의해 쫓겨나거나 거기서 살기 힘들어 벗어난 ‘탈주자’들”이었던 ‘왜구’. 저자는 그 왜구에서 이주의 시대에 비가시적인 존재이자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인 한국 이주민들의 형상을 본다. 따라서 그 몽상 또는 질문은, 비국가적이고 외부적이며 소수적인 존재들을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배제했던 대문자 역사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제기이자, 오늘날 또 하나의 왜구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절절한 공감과 연대에의 호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