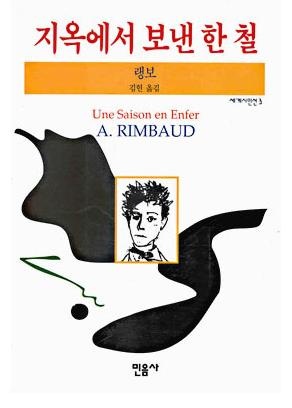한찬희 /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랭보, 내 청춘의 열병
원고청탁을 받은 후 적잖이 고민을 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문장을 기억하는 일 따위는 맞선자리에서 물어보는 구태의연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던가. 그러나 문득 시간은 15년 전으로 나를 이끌었다.
“예전에,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온갖 술이 흐르는 축제였다.” <지옥에서 보낸 한 철> 중 ‘서시’의 앞부분이다. 열아홉, 처음으로 랭보와 만났다. 정확하게는 <토탈 이클립스>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랭보였지만, 그 첫 만남은 강렬했다.
돌이켜보면 첫사랑의 열병과도 같았던 10대 시절, 순수하고 뜨거웠을 그 시절은 ‘음탕한 몸짓’과 ‘질척한 축제’로 보낸 시간들이었다. 아름다웠다고 회상하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이 연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자리에 강요되는 관습은 내 숨통을 조여 왔다. 살고 싶었다. 제도적 틀 안에서 위치지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제도권 밖으로 이탈했고,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시작되었다. 그때 만난 랭보의 자유분방함은 곧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가 했던 고민을 함께 하고 싶었다. 창작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껴보고 싶었다.
평론가들은 말한다. “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감각이 뒤틀렸을 때 보여지는 사물의 현현”이 랭보의 시적 이상이라고. 구토를 유발하는 비린내나는 악취, 이것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모든 감각이 뒤틀린 상태에서 내 시선에 들어온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내가 서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현실로서 다가왔다.
아름다움에 대한 규정. 내가 보낸 10대 시절이 추함으로, 혹은 아름다움으로 기록될지 알 수 없다. 그때의 고민들이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게 한 것은 틀림없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 시절이 지옥이었는지 앞으로 살아가야할 시간이 지옥인지는 알 수 없다.
15년 전에 15년 후의 모습으로서 만났던 랭보, 그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카니발적 축제로 회상해본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던 그 시절, 이미 나의 존재는 그 이유에 물음을 던지는 순간 완성되지는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