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령 /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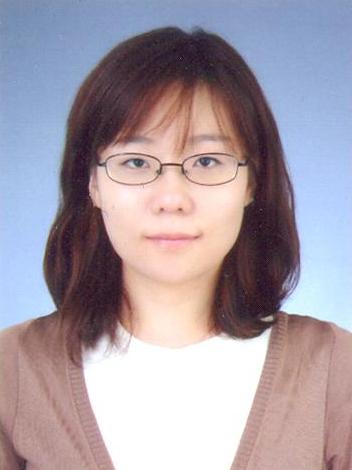
대학원에는 다양한 학과와 연구회, 원우들이 있지만 이들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신문 1면에서 학내의 다양한 문제를 꼼꼼히 진단해 알린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주로 지난 학기에 제기되던 연구공간, 성폭력, 조교 제도 문제를 후속기사로 꼼꼼하게 다뤄서 각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대학원에 온 만큼 각자의 연구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학기 신문에서 인상적인 것은 보다 다양해진 기획기사이다. 지난 학기는 유독 서평지를 읽는 듯 책에 의존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기획기사가 눈에 띄어 반가웠다. ‘학술기획’과 ‘학술동향’ 기획기사로 학술지로서의 중심을 잘 잡으며, ‘문화비평’을 통한 문화트렌드 엿보기, ‘국제’, ‘과학’, ‘사회’면을 통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 엿보기 등은 신문을 한층 풍요롭게 했다. 특히 ‘국제’, ‘사회’면에서 다뤄진 ‘새정부 실용외교 진단’과 ‘학문후속세대의 현재와 미래’는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앞서 ‘엿보기’라는 표현을 썼듯이 대부분 각 기획 주제를 설명하는 데만 충실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은 궁극적으로 신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각 기획의 기사배치가 면마다 분절된 느낌을 주어 산만한 느낌이 든 점이 아쉬웠다.
그외의 기사에서는 이슈가 된 대학원 동문 원우를 만나는 ‘중앙열전’과 ‘자전거는 쫤다’가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중앙열전’을 보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원우들을 만나는 신선함은 있었지만 지면이 짧아 그저 소개에만 그쳐 안타까웠다. 반대로 ‘자전거는 쫤다’는 수필처럼 가벼운 문체로 쓰여, 편안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대학원신문을 매 학기 읽으며, 학기마다 변화하는 신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완벽한 만족은 세상에 없듯, 이번 학기 신문을 보며 느꼈던 아쉬움을 발판으로 다음 학기에는 더욱 발전하는 대학원신문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