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석 / 성균관대 정치학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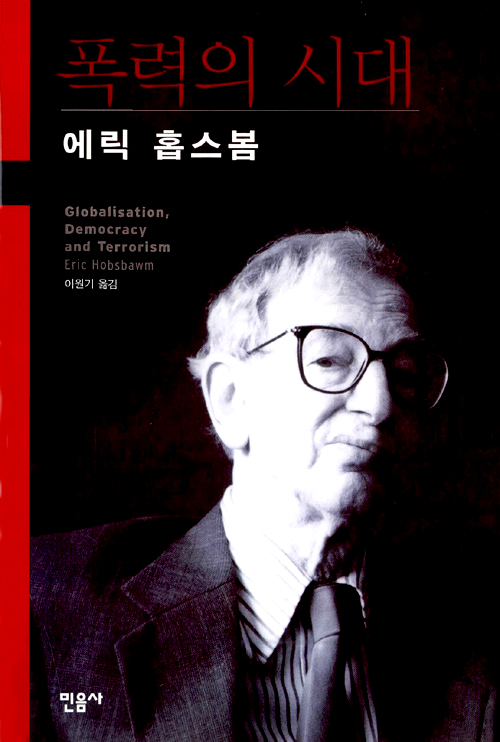
그러나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계 혹은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질서와 안정은 누군가가 저지른 폭력의 결과이거나 폭력적 프로젝트가 아닐까?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세계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가? 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질서로 재편하려는 것은 미국의 제국적 욕망이다. 그렇다면 홉스봄은 왜 이 무질서와 불안정성에 대해 그토록 우려하는 것일까?
‘인도주의적 제국주의’의 야만적 실체
홉스봄은 ‘인권’을 위해 타국에 개입하는 ‘인도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이 고약한 정권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는 야만을 제압하기 위한 더 큰 야만이다. 홉스봄은 인도주의라는 미명 뒤에 은폐된 미국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드러내주고는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코소보전쟁에 대해 철학자 하버마스가 취한 입장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토의 군사적 개입을 ‘용감하게도’ 찬성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인권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는 세계시민권의 확립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적극성은 홉스봄과 매우 다르다. 새로이 등장해야 할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는 훌륭하다. 다만 이러한 적극성의 단점은 항상 특별한 정당화가 요구되는 만큼 결과에 있어서 과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테러는 또 다른 무질서의 징후이거나 핵심이다. 홉스봄이 핵심을 찌르고 있듯이 ‘테러’ 그 자체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며 배격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적 제국의 야심을 정당화하려고 그 두려움을 부추겼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다. 테러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지 호들갑을 떨며 공포를 부추겨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홉스봄은 현재 가장 명백한 전쟁 위험은 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미국정부의 세계적 야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해본 것들 중에 그나마 민주주의가 낫기 때문에 채택했지만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전장을 내민 다른 제도들이 너무도 형편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그 민주주의도 국가와 정부의 통제능력이 쇠퇴하여 전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초급진적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유행함으로써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민영서비스가 공공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정부 운영도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것이 ‘시장 주권주의(market sovereignty)’이다. 이는 헐어빠진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해버렸다. 하지만 홉스봄은 “국가를 완전히 초월한 자유방임적 세계시장의 이상향은 오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자위한다. 그러나 곧바로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나 지구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한탄한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01년 9월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로 확산되고 외국에 대한 무력 개입이 재개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것은 테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과잉대응 때문이었다. 정부와 언론이 손잡고 테러를 집중 홍보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국의 정책은 터무니없는 ‘적’을 만들어 냉전시대의 종말론적 공포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힘을 한층 강화하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로부터 전쟁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홉스봄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은 세계 곳곳에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권유를 확고히,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이 소외당한다고 느끼고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미국이 과대망상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외교정책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과연 홉스봄을 포위하고 있는 이 지독한 비관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