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와 문화
이도흠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처럼, 문학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관점은 맑시즘과 형식주의라는 두 축이 대립하였고 양자의 종합은 비평계의 요원한 숙제였다. 문학을 현실의 반영으로만 보려 한 관점이나 문학을 현실과 유리된 꿈의 양식으로 보려 한 관점, 문학과 미학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종속시켜 해석하는 방식, 텍스트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텍스트 그 자체만을 분석과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 모두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한 쪽은 텍스트를 현실이나 사회적 맥락에 종속시키고 문학 텍스트의 시학적 구성을 회피하여 결국 과학적 객관성과 문학성, 텍스트 자체의 미적 특질과 문학성을 앗아간다. 반면에 후자는 문학을 현실로부터 일탈시켜 삶의 구체성을 제거하며 문학해석의 지평을 축소한다. 이 비평방식은 문학에 작용하는 외부 사회적 요인이 문학 자체의 고유 요인, 문학의 내재적 발전 요인이자 미적 자질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화쟁기호학은 화쟁철학을 바탕으로 양자를 종합한다. 서양은 오랫동안 실체론적 사고, 동일성의 사유를 해 왔다. 이런 사유는 이성중심주의를 가져오거나 동일성의 사유를 통해 타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낳는다. 올해 탄생 150주년이 되는 소쉬르는 실체론적 사고를 하던 서양 인문학에 관계와 차이의 지평을 열었고, 이는 지금도 들뢰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쟁기호학도 불교의 논리체계를 따라 관계와 차이의 사유를 한다. 하지만 소쉬르와 달리 A or not-A의 2분법을 넘어서서 A and not-A의 퍼지 식 사유를 통하여 양자의 변증법적 종합이 아니라 화쟁의 아우름을 이룬다. 화쟁기호학은 화쟁의 원리를 따라 텍스트와 맥락, 기표와 기의, 작자와 독자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동시에 차이의 읽기를 한다. 실체론적 사고는 이항대립의 사유를 낳고, 자크 데리다의 지적처럼 “이항대립적 사유에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계층질서가 존재한다.” 데리다는 이성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형이상학이 정신/육체, 이성/광기, 주관/객관, 진리/허위, 기의/기표, 인간/자연, 남성/여성 등 이분법에 바탕을 둔 야만적 사유이자 처음과 마지막에 “중심적 현존”을 가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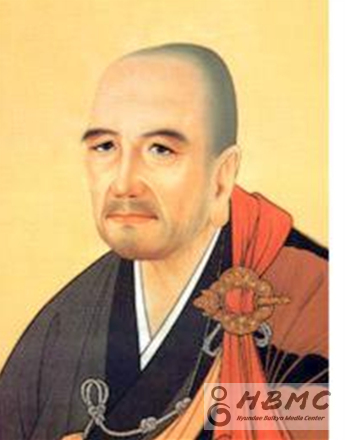
홍수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서구 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이항대립으로 나누고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었기에 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을 썩게 하고 결국 수많은 생물을 죽이기도 한다. 이렇듯 이항대립에 바탕을 둔 서구의 패러다임은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를 비롯한 모든 현대성 위기의 동인이었다. 댐을 쌓는 것이 현대적, 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쟁의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졌던 신라시대의 최치원은 홍수를 막기 위하여 물길을 트고 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의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에 가면 낙엽활엽수림으로선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림이란 숲이 있다. 신라 진성왕 때 이곳의 태수인 최치원은 홍수로 툭하면 넘치는 위천의 물길을 돌리고 이 숲을 조성하였다. 하림은 사라져버렸으나 지금도 114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목이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댐과 달리 숲은 빗물을 품었다가 정화한 다음 서서히 내보낸다.
화쟁의 일곱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인 불일불이는 차이를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자는 사유체계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열매와의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 씨와 열매는 별개의 사물이므로 하나가 아니다[不一]. 국광 씨에서는 국광사과를 맺고 홍옥 씨에서는 홍옥사과가 나오듯, 씨의 유전자가 열매의 거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고 열매는 또 자신의 유전자를 씨에 남기니 양자가 둘도 아니다[不二]. 씨는 열매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공(空)하고 열매 또한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 또한 공하다. 그러나 씨가 죽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를 낸다. 씨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면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씨가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자신을 흙에 던지면 그것은 싹과 잎과 열매로 변한다. 공이 생멸변화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쟁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투쟁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체계이다. 서구의 이항대립의 철학이 댐을 쌓아 물과 생명을 죽이는 원리를 이룬다면, 화쟁의 불일불이는 그 댐을 부수어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며, 물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은 물을 흐르게 하는 원리이다. 화쟁의 불일불이는 이항대립적 사고, 우열과 동일성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철학과 통한다. 그러나 대안이 거의 없는 데리다에 비해 화쟁은 차이와 상생의 사유체계이다.
화쟁기호학은 먼저 원효의 화쟁의 원리를 따라 상체용(相體用)과 은유와 환유의 원리를 결합하여 세계의 인식과 그 의미작용을 종합한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표명하는 방식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유추하고 기호화하는 은유와 ‘인접성’을 바탕으로 유추하고 이를 기호화하는 환유로 나누고 이를 체용상(體用相)의 틀로 체계화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 반영상과 프리즘이 한 줄기 빛을 무지개로 바꾸듯 현실을 굴절시킨 굴절상으로 분절하고, 각 텍스트에 담긴 세계를 화엄철학의 사법계로 나누어 분절한 후 기호학적 분석을 한다. 반영상에는 현상계와 원리계가 포개진다. 현상계를 시학에 적용할 때, 현상계는 인간이 마주친 사물이나 현실이다. 쓰는 주체가 현상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물과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 사물에 내재하는 보편원리라고 직관으로 깨달은 경지는 원리계이다. 진자계(振子界)는 쓰는 주체가 지향의식에 따라 현실과 사물, 그리고 이들에 내재하는 원리를 발견한 후 이 원리를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과 욕망, 당위와 존재, 이데올로기나 신화와 삶, 개별적 삶과 보편적 삶, 절대와 상대, 현상과 본질, 역사적 존재와 실존적 존재 사이를 시계의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계이다. 승화계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승화하여 이룩한 총체성의 세계이다.
화쟁, 끊임없이 텍스트를 닫고 열다
텍스트는 타자의 수많은 흔적이 중첩되고 다른 텍스트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열린 체계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의미작용 체계에 적용하였던 체용상의 범주를 ‘품, 짓, 몸, 참’으로 범주화하여 형식주의와 역사주의, 맑스주의 사회학과 구조적 시학, 해석학과 수용미학, 공시태와 통시태를 종합하는 체계로 활용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몸은 텍스트의 짓을 통하여 드러나며, 텍스트의 짓은 텍스트의 품을 결정한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를 만나 미적상관을 하면서 드러나며, 작자는 텍스트의 짓에 맞추어 텍스트의 품을 만든다. 여기서 인간의 의미작용과 원리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구조가 있고, 인간 주체의 세계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식을 규정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를 ‘세계관’으로 명명한다. 세계관과 주어진 문화체계 안에서 읽는 주체는 코드에 따라 의미작용을 일으키는데 주체가 자신의 취향, 이데올로기, 발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텍스트는 지시적·문맥적·표현적·사회역사적·존재론적 가치를 갖는다.
이처럼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차연으로서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고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연기된다. 텍스트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작자와 텍스트, 독자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읽기의 과정을 통하여 읽는 주체를 자유롭게 한다. 인간 주체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읽기를 통하여 이미 낯익은 세계를 낯설게 만나고, 세계의 숨겨진 의미에 다가가며, 자신을 억압하던 관념에서 해방된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라. 눈동자에 맺힌 내 모습을 ‘눈부처’라 한다. 눈부처를 보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다. 화쟁기호학은 텍스트에서 눈부처를 생성하게 하고 만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