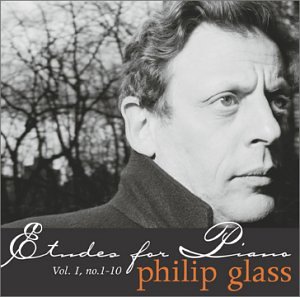이야기가있는클래식
양한수 / 소네트뮤직 대표
근·현대음악의 의미가 수월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속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편견이다. 세기말 이후 음악내용의 변천 과정을 들어 그 원인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과장된 감동을 유도하던 낭만주의 후기 음악에 비하여 인상주의자들의 안목은 극히 주관적이었다는 점에서 벌써 청중들의 마음은 심란해지기 시작한다. 독일계 음악의 민족주의적 색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상반된 관점이었을 터였다. 사사로운 정서를 시시때때 직관적인 감상을 통해 연주했고, 이들의 음악언어는 대단히 분방한 섞임을 실현했다. 재즈와 동방세계 문화가 그들 음정에 녹아들었고 시각적인 색채가 담겨 세심한 청중들을 당황케 했다.
이후 새로운 음색을 찾는 음악가들의 필요에 따라 전자악기가 고안되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 마치 20세기 색면화가들이 원근법보다 평면상의 색상 채도에 의미를 두었듯이 현대음악은 멜로디보다 독특한 음향이 전하는 색채감을 전자악기나 자연음에서 찾기도 했다. ‘웬디 카를로스’가 1960년대에 새로운 악기를 통해 ‘바흐’의 푸가와 몇 개의 피아노 평균율 모음곡을 연주하여 음반에 담았을 때, 첨단 악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거슬러 바로크시대의 음악과 만나 그 가능성을 실험한 바 있었다. 그래도 ‘바흐’의 지고한 음악구조를 외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당시 반응은 첨예하게 상반된 방향으로 나뉘었다. 전자악기의 아름다운 음색을 전통악기의 사생아인 것처럼 폄하하는 논지와 미래음악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서로 부딪쳤지만 결론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절대적인 음향미학에 비하여 기능성을 도외시하지 않는 최근 음악 전반에 전자악기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모차르트’ 시대에 전자악기가 존재했다면 서양음악의 판도가 전혀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음악가의 분방한 창작의지에 견주어 보아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결국 문제는 세기말 이후 비주류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행태를 어떤 관점에서 수용하느냐에 모아진다. ‘드뷔시’나 ‘사티’의 화음에 담긴 몽환적인 이미지를 두고 표제의 의미를 찾으려 애써보지만 답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다. 단순한 느낌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난삽한 분석을 곁들여 이해해야 하는 과제로 여기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